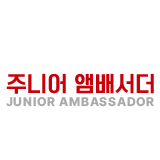인공지능은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나, 제품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팅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딥러닝’, 더욱 풀어 말하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하는 기술로써, 기존의 컴퓨팅 기술이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작업만을 수행하는 수준이라면, 머신러닝 기술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계를 ‘학습’ 시킴으로 인해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해준 기능을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었기에 비로소 ‘인공지능’ 기술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곳에 있습니다. 주어진 명령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새로운 결과값’을 산출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 한대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해당 창작물을 잘 만들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일 뿐 인공지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 인해 프로그래머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인공지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Photo by Yuyeung Lau on Unsplash
발명은 이제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라는 생물의 특별한 능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간단한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하는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있지만, 그것이 ‘발명’의 영역에는 미칠 수 없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아닌 프로그램이 새로운 ‘발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는 수백년 간 쌓아온 바둑이라는 스포츠의 기틀을 현격하게 변화시켰고 완전히 새로운 바둑을 보여주었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인공지능은,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발명가가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일까요?
현재로서 답은 “아니다”입니다. 현대 문명의 기틀은 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과 제도, 사회 규범 모두 인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발명가”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발생하는 법입니다.

사진출처 : freepik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세일러(Stephen L. Thaler) 박사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세계 각국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다부스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라는 명칭으로 16개국에 특허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 6월 3일 국내에도 특허 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습니다. 사실상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 세계에 특허를 출원해왔던 스티븐 테일러 박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최근 호주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초 호주 특허청에서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호주 연방법원에서 독특한 호주의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이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난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2.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 역시 없다.
3. 발명자를 뜻하는 단어인 ‘inventor’가 ‘엘리베이터(elevator)’등과 마찬가지로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발명자를 인간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발명하는 물건도 허용할 것이냐는 논란을 뚫고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받은 호주의 사례에 반해, 다소 싱겁게 다부스(DABUS)가 특허를 인정받은 국가도 있긴 합니다.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인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형식적인 심사 후에 지난 7월 특허를 승인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한 제도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DABUS의 국내 특허 출원 내용
인공지능의 미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발명한 경우, 현재는 보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해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제도가 그에 맞추어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쩌면 조금은 늦은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미래를 상상하는 힘’, 그리고 ‘예측하는 힘’이 있는만큼, 앞으로 다가올 기술 발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 DABUS – Artificial INVENTOR (https://artificialinventor.com/dabus/)
2. DABUS : decoding Australia’s AI Decision